조직의 기억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누구나 일을 하며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 일을 통해 성장 중인 우리 시대 스마트 워커를 위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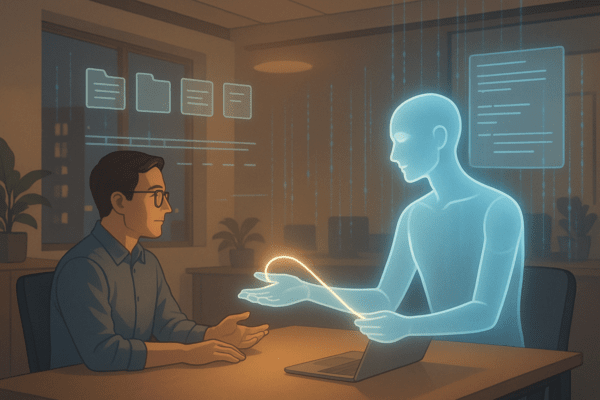
“전임자가 쓴 파일은 어디 있나요?”
“그건 지난 공유드라이브에 있을 텐데요…”
“있긴 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업무 인수인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사다. 파일은 남지만 맥락은 사라진다. 프로세스는 공유되지만, ‘왜’와 ‘어떻게’는 사라진다. 결국 신입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조직의 지식은 개인의 기억에 묶인 채 증발되고, 우리는 매번 새로 시작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문제, AI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기업들은 챗GPT 기반의 조직공용 AI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또한 회의의 모든 대화를 자동저장하여 분석하는 솔루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 검색을 넘어, 대화형 파트너처럼 조직의 정보와 문맥을 기억하고, 구성원의 질문에 자연어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업무 인수인계 역시 이 구조를 적용하면 매우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
“작년 5월 마케팅 캠페인은 왜 성과가 낮았지?”
“기존 전략 대신 타겟 세그먼트를 바꿨던 이유는 뭘까?”
“이 문서는 누가 어떤 회의에서 결정해서 작성된 거야?”
과거에는 불가능했을 질문들이다. 하지만 조직공용 AI는 회의록,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마치 조직 전체의 ‘집단 뇌’를 구축해두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이 아니라 ‘맥락’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기존 인수인계는 정리된 문서와 매뉴얼 중심이다. 하지만 AI 기반 인수인계는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고, 무엇을 고려했는지”라는 의사결정의 흐름을 함께 전달할 수 있다.파일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다. 마치 선배가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인수인계는 ‘정보’를 넘어서 ‘관계의 기억’을 전달하는 일이다. 누구와 함께 일했고, 그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어떻게 설득되었고, 어디서 마찰이 있었는지. 이런 미묘한 기억은 파일로 남지 않지만, 수많은 회의와 메시지에 녹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파편들을 AI가 모아 다시 ‘맥락’으로 되살릴 수 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문화. “이 업무는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라는 질문이 허용되고 장려되는 문화 없이는, 어떤 AI도 좋은 답을 줄 수 없다.
둘째, 조직기억의 자동화된 기록. 모든 회의와 결정 과정을 AI가 요약하고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회의록 자동화 툴들이 각광받는 이유다.
셋째, 프라이버시와 권한 설정. 모든 정보를 누구나 열람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감도에 따라 레벨이 다른 질문과 응답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가 갖춰지면, 인수인계는 더 이상 ‘양식 작성’이 아니라 ‘대화 설계’가 된다. AI는 단순한 자료 제공자가 아니라, 맥락을 전달하는 협력자가 된다. 나아가, 사람은 떠나도 조직의 기억은 남아 계속 대답해줄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스마트워크가 아닐까?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일, 1년 뒤 새로운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때 조직의 AI가 대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반복을 줄이고, 진짜 혁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대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파일 대신 대화를 남기자.

![[동학] 카카오톡 친구탭, 결국 12월 롤백… “격자형 피드는 선택 옵션으로”](https://cdn.kmjournal.net/news/thumbnail/custom/20251126/5517_10550_1119_1763853080_120.jpg)


![[테크 칼럼] 제미나이3, GPT-5.1을 넘다…AI는 이제 ‘일을 대신하는 시대’로 간다](https://cdn.kmjournal.net/news/thumbnail/custom/20251126/5457_10454_4847_1763621329_120.jpg)





